|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 JavaScript
- 이와타씨에게 묻다
- 줬으면 그만이지
- 매트로폴리탄
- openAI
- hal연구소
- 야매요리사
- Ai
- 퀴즈게임
- 마담 프루스트
- 운석피하기 게임
- 타자연습게임
- 게임개발
- 제이슨 슈라이어
- comfyui
- 타이핑좀비
- Stable diffusion
- Python
- 황선엽
- pygame
- 타이핑 몬스터
- Gym
- 시집
- 나는 매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입니다.
- frozen lake
- gymnasium
- 에릭 바론
- 상식의발견
- 단어가 품은 세계
- Today
- Total
스푸79 기록 보관소
허송세월-가지볶음밥을 음미하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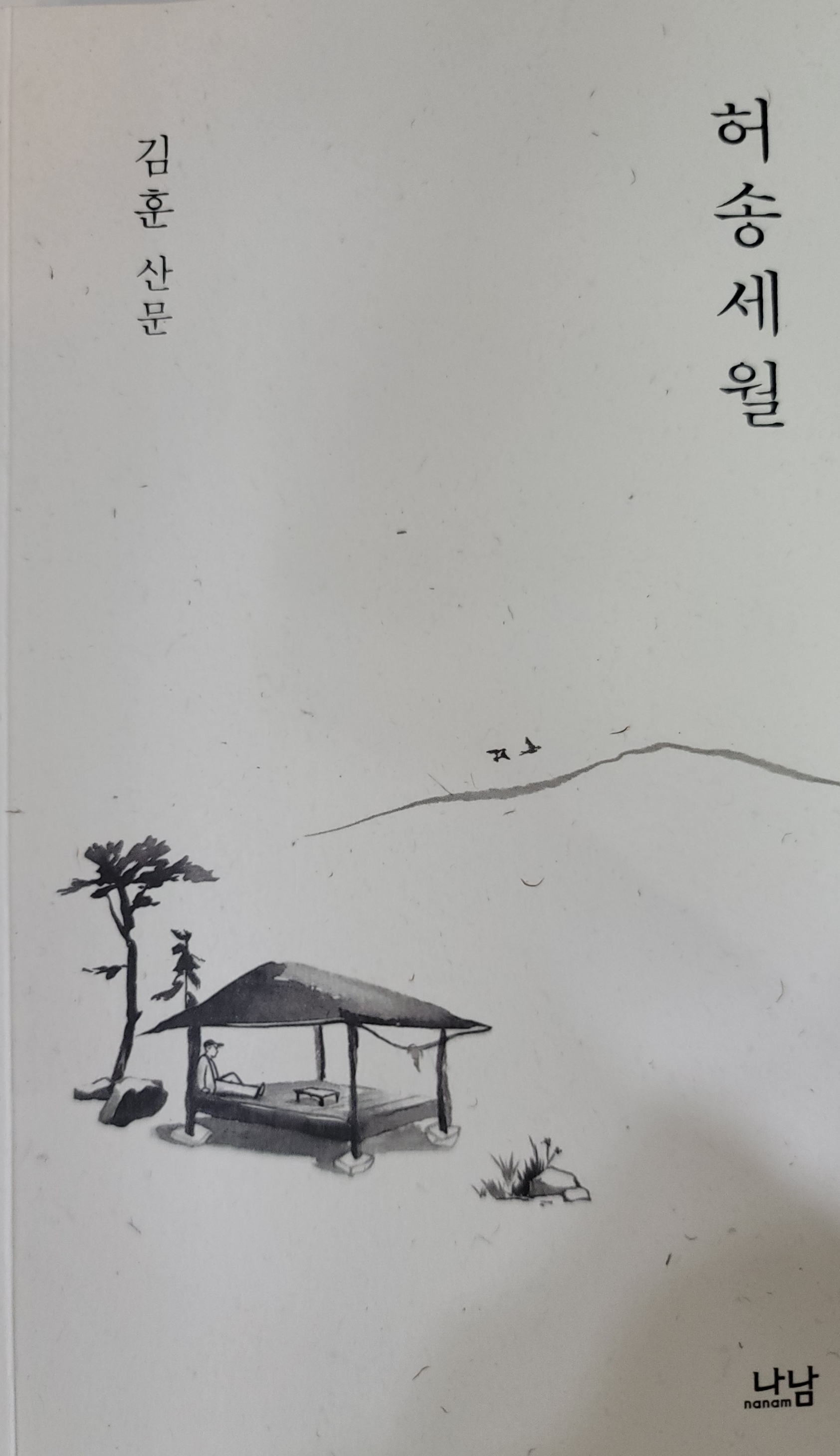
나는 어릴 적부터
반찬 투정을 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은 적이 없다.
당근은 물론이고 연근과 같이
입 안에서 단단히 곱씹어야 맛이 나는 채소도
가리지 않고 우걱우걱 잘 씹어 먹는 편이었다.
그런 내가
꺼려하는 유일한 반찬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지였다.
대충 배고플 때
고추장에 이런 저런 반찬을 넣고 비비면
밥풀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지 반찬이 좀 들어가 있다면 그게 되질 않았다.
뭔가 딱딱한 듯하면서도 물렁한 그 식감이 나는 너무 싫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그릇 한 곳에 가지만
싹싹 긁어모아 두곤 했다.
내가 편식하는 유일한 채소
그것은 바로 가지였다.
어느 중국집에서 가지볶음밥을 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3년 간의 부산 출장 생활을 끝내고
서울 본사 사무실로 다시 출근을 시작한 첫날
타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다며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팀장님은 회사 식당이 아닌
본사 지하 식당가로 나를 데려갔다.
인테리어가 아주 세련되게 잘 된 고급 중식당으로 들어갔다.
중국집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나는 놀랐다.
볶음밥이 만원이라니...
가격에 크게 놀랐다.
그 당시는 2015년 보통 중국집에
볶음밥은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였다.
그리고 메뉴판에 있는 가지볶음밥이 보였다.
가격은 무려 만이천 원
그냥 볶음밥보다 이천 원이나 비쌌다.
무엇보다 가지로 된 볶음밥이라니
'가지 볶음밥을 누가 먹는단 말인가? 그것도 이 가격에...'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궁금했다.
대체 얼마나 맛있게 만들길래
저 가격에 팔고 있을까?
팀장님이 사주시는 건데 혹시나 남기면 어쩌지 고민했다.
그냥 안전하게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킬까
나는 계속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가지볶음밥을 큰 마음을 먹고 주문했다.
보라색 가지가 송송 썰린 볶음밥이 나왔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가지 볶음밥을 시켜놓고
가지를 안 먹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첫 숟갈을 가지와 밥을 크게 떠서 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오물오물 가지를 씹는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숨겨진 가지의 맛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된 가지요리를 여태껏 먹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다.
딱딱함과 물렁함 그 어중간한 식감
내가 싫어하는 그 식감이 주는 진짜 맛은
고기맛 그 자체였다.
야채를 먹고 있지만 고기를 씹는 느낌
'아, 가지가 원래 이런 맛이었구나.'
태어나 처음으로 가지로 조리된 요리를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을 수 있었다.
김훈작가님의 소설
'남한산성'을 앞에 두고 읽기를 망설였던 내가 떠오른다.
뻣뻣한 옛 어르신 문어체
딱딱하고 짧은 문장
중간중간 사전을 찾아서 뜻을 헤아려야 하는 어려운 한자어가 섞인 문구
나에게는 읽기 전부터 재미가 있을 수 없는 소설이었다.
가지볶음밥을 먹기 전 가지의 맛을 몰랐던 것과 같았다.
'남한산성'을 읽고 또 한 번 더 읽었다.
너무 좋은 문구는 흉내라도 내고 싶어 필사도 해 보았다.
그리고 김훈작가님의 책은
수필, 소설 가리지 않고 모두 읽었다.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가님의 표현과 글귀는 나와 시대가 달랐다.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문장을 채운 두세 글자의 한자로 된 단어나
잘 쓰지 않는 오래된 표현
내 깜냥으로는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것이었다.
아주 짧은 문장조차
신기하게도 다음 문장과 흥겹게 이어져 있는
작가님의 글은
읽는 동안 우리말의 맛을 냈다.
나도 모르게 십여 장을 그냥 우습게 읽어갔다.
그렇게 좋은 글과 소설을 쓰셨던
김훈 작가님도
몸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
마음 헛헛하시다고 한다.
그 말만 들어도 먹먹해질 뿐이다.
평생 저런 좋은 글을 쓸 재주조차 없는 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해본다.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다가 들린다-언제부터 그녀를 좋아했을까? (40) | 2024.09.30 |
|---|---|
| 베테랑2-탄산 빠진 사이다 마시기 (35) | 2024.09.27 |
| 부지런한 사랑-일기에 답글만 달았을 뿐인데... (46) | 2024.09.19 |
| 에펠탑 아래의 작은 앤티크 숍-100을 주는 사랑은 위험하다. (46) | 2024.09.11 |
| 괴물-나는 정말 괴물일까? (25) | 2024.09.09 |





